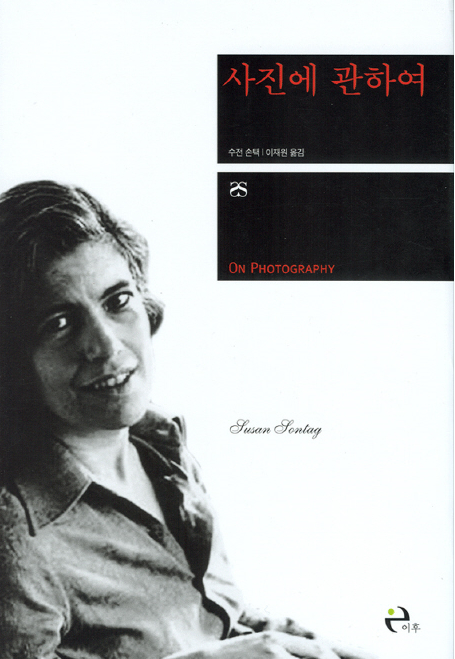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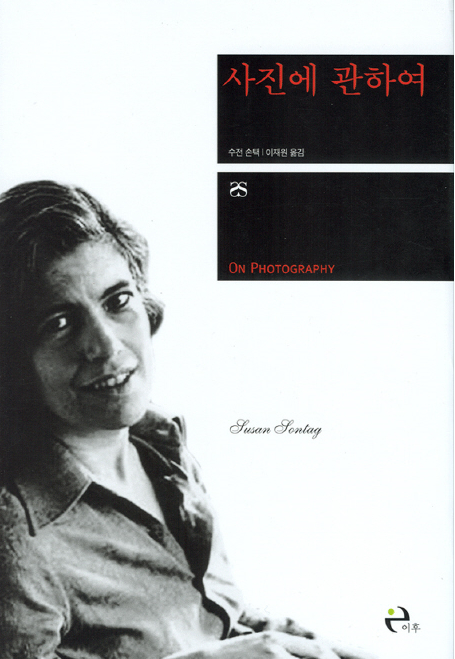
■ 수잔손탁 - 사진에 관하여는 사진론의 고전이 된 책이다.
사진공부하려고 할 때 꼭 만나게 되는 이름이 수잔 손탁이고, 발트 발야민이고, 롤랑 바르트와 존버거이다. 그들은 사진가가 아니라 문학가, 미학자, 평론가, 철학자들이다. 적어도 전문사진가라면 이 정도 책은 한권쯤은 읽고 소화해 낼 수 있어야 할지 않을까요? 더불어 강의까지 할만큼 충실히 책을 읽어내고 소화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20세기의 주요 기록매체인 사진의 본성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된 바 없는(혹은 조심스럽게만 제기되어 왔던) 질문들을 직접적으로 던져 ‘언젠가는 해야만 할’ 논쟁을 촉발시키기까지 했다
사진이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사진을 수집한다는 것은 초현실주의자처럼 현실을 몽타주하고 역사를 생략해버린다는 것이다” “사진은 이 세계를 백화점이나 벽 없는 미술관으로 뒤바꿔놓아 버렸다” “그 사람의 삶에 끼어 드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누군가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의 핵심이다” 등등의 논쟁적인 주장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진에 관하여>는 1839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은(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사진의 본성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그 경험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것과 똑같아져 버릴 만큼 사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록매체가 됐다. “19세기의 가장 논리적인 유미주의자였던 말라르메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책에 씌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것들이 결국 사진에 찍히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버렸다”라는 손택의 지적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말이다. 그렇지만 사진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피사체로 둔갑시켜 소비품으로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미적 논평의 대상으로 격상시킨다. 그에 따라 결국 사람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구매하거나 구경하게 된다. 사진 덕택에, 혹은 사진 탓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살아지게’ 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사진에 관하여> 한국어판의 특징
1. <사진에 관하여>는 지은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손수 정리해 들려준다거나,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또 다른 각도에서 확인만 시켜주기를 바라는 읽는이들의 바람을 완전히 저버리는 책이다. 오히려 손택은 서로 상반된 주장·인용·자료 등을 태연히 ‘병치’(‘이 문제를 이렇게 봐 봅시다. 그리고 저렇게도 봐 봅시다’)해 놓거나, 어느 지점에서 기존의 논의 방향을 갑자기 비틀어(가령 “~이다. 그렇지만~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상이한 관점들을 ‘충돌’시키는 저술 방법을 택하고 있다. 요컨대 손택은 자신의 문학적 행위예술(해프닝)을 통해서 읽는이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따라서 자칫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를 손택의 논의를 읽는이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사진에 관하여> 한국어판에서는 총 13쪽에 걸쳐 78개의 자세한 옮긴이 주를 수록했다.
2. 또한 손택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아니면 간단히 언급하는 여러 사진들을 읽는이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사진에 관하여> 한국어판에서는 총 29장 사진도판을 수록했다. 손택은 자신이 언급하는 사진들이 매우 유명한 사진들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영어판에는 사진도판을 전혀 수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보자면 한국어판은 영어판보다 훨씬 더 ‘친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책 <사진에 관하여>는 1986년과 1994년 각각 <사진이야기>(유경선 옮김/해뜸)와 <사진론>(송숙자 옮김/현대미학사)라는 제목으로 국역되어 나온 적이 있다. 이번에 새로 국역된 <사진에 관하여>는 기존의 두 국역본이 잘못 번역해 놓았거나 누락시켜 그동안 국내 독자들에게 잘못 이해되어 왔던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모두 원문에 충실하게 정정하려고 노력했다.
|